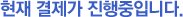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 DAY08. Habits are scary.
- EDIT BY 재인 | 2024. 1. 2| VIEW : 41

우리는 그 사이에 마주 앉아 지난해 서로에게 남은 습관들을 헤아려봤다. 연말이 되면 으레 갖는 시간이다. 원해서 얻은 습관과 원치 않아도 몸에 밴 습관 사이로 흘러간 시간들이 스며 나왔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날이 추워지면 기온을 확인한 뒤 수돗물을 살짝 틀어 두고 퇴근한다. 서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는 오랜 시간 서있는 일에 익숙해지고, 회사 밖에서 자유로이 일하는 프리랜서는 무너지는 루틴을 막기 위한 운동을 갖기 위해 애쓴다. 비정기적으로 무대에 서는 배우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위해 프로필을 돌리고, 시를 쓰는 친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어느새 굳은살처럼 습관이 된 일들. 어느 날 버스를 타면서 큰 소리로 기사님께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옆에 있던 친구가 대신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나도 가게 생활이 드러나는 습관에 어이없는 실소를 터트렸다.
내게도 기쁜 변화로 일기를 끝까지 매듭짓는 습관이 생겼다. 예전에는 하루를 세세히 적어 내리다가 제풀에 지쳐 포기한 일기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습관을 바꾼 건 선물 받은 책 속에 나온 단 한 구절 때문이었다. ‘잊어버리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포기하거나 대충 끝내고 싶어지며, ‘기타 등등’이라고 써버리고 싶어진다. 하지만 ‘기타 등등’이라고 쓰지 않는 것이 목록 작성의 핵심이다.’[1] 나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이 문장이 아름다웠다. 우리 삶을 기타 등등이라고 헝클어트리지 않고 말하는 것. 삶을 대충 흘려보내다가 습관이 된 어느 날에서야 문득 깨닫지 않는 것. 그것이 내 글과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데려가줄 것 같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생기는 막연한 불안을 다스리는 습관. 이 습관 역시 다음 문장에 기대어 들인 습관이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뿐이다. 많은 미래를 상상하면 미래는 그저 그것들 중 하나에 그친다.’[2]
누군가 만든 창작물 속에서 나는 그들의 의도대로, 때론 의도치 않은 대로 답을 찾게 된다. 앞으로도 그런 문장 위에, 그런 장면 속에 머물고 싶다. 습관이 될 때까지.
[1] 『브라이언 딜런』, 브라이언 딜런
[2] 「익익월」, 『소공포』, 배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