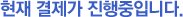2018년 4월. 내가 커피사에 처음 방문한 날이다.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으로 당시 상호는 ‘커피사 마리아’였다. 커피사는 이민선 대표가 바리스타라는 직업명을 한국식으로 바꿔본 단어다. “셰프는 요리사인데 바리스타는 왜 바리스타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마리아는 그림을 그리는 이마리아 작가를 칭한다. 커피사와 마리아. 각기 다른 일을 하는 두 사람은 공간을 함께 쓰기로 했다. 요컨대 이곳은 카페이자 아티스트의 작업실이었다.
2018년 4월. 내가 커피사에 처음 방문한 날이다.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으로 당시 상호는 ‘커피사 마리아’였다. 커피사는 이민선 대표가 바리스타라는 직업명을 한국식으로 바꿔본 단어다. “셰프는 요리사인데 바리스타는 왜 바리스타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마리아는 그림을 그리는 이마리아 작가를 칭한다. 커피사와 마리아. 각기 다른 일을 하는 두 사람은 공간을 함께 쓰기로 했다. 요컨대 이곳은 카페이자 아티스트의 작업실이었다.

첫 방문의 기억. 오래된 인쇄소와 공업사로 즐비한 투박한 동네, 줄지어 늘어선 조명 가게를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이런 데 카페가 있다고?” 거친 기계음이 새어 나오는 작업장을 뒤로 한 채 3층에 도착했다. 그리고 회색 철문을 열었다.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바닥에 깔린 연한 핑크빛의 카펫타일과 양쪽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볕, 하나의 스타일로 이름 붙이기 어려운 빈티지 가구들, 구석구석 걸려 있는 그림까지. 무엇보다 나를 매료시킨 건 카페와 아티스트의 작업실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었다. 커피와 예술이라… 나는 이런 멋에 약하다.

‘아트’를 콘셉트로 내세우며 무게를 잡아 보려는 카페들은 많다. 실제로 을지로에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거기가 다 멋있느냐 묻는다면 대답을 아끼겠다. 멋을 보여주기 위해 안간힘 쓰는 모습은 멋없기 때문이다. ‘힙지로’라는 괴상한 트렌드가 득실거릴 때 특히 그랬다. 대체 을지로스러운 게 무엇인지, 가는 곳마다 죄다 어둡고 답답하고 불편했다. 간판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최소 3층에, 무너져 내릴 듯한 노출 콘크리트와 꽃무늬 커튼, 미러볼, 강렬한 기운의 해외 배경 사진, 비주얼만 요란한 식음료 메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레트로'라는 만능 키워드. 나로서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힙’의 정의나 레트로와 뉴트로의 차이 따위를 진즉에 통달한 것인지 이들은 위풍당당하게 자기 공간을 전시하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거기 같았다는 것이다. ‘을지로 감성’이라는 거대한 이미지만 둥둥 떠다니고 그 안에 존재하는 개별 가게의 매력과 개성을 파악할 길은 요원했다. 그렇게 어두운 실내를 전전하는 동안 눈은 침침해지고 의자보다 낮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느라 허리 통증만 늘었다. 못 이기는 척 몇 차례 방문을 시도했지만 나는 끝까지 그 ‘갬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커피사 마리아는 달랐다. 낡고 어두운 건물이 주는 거친 느낌과 상반되는 아늑한 분위기가 있었다. 조명은 밝았고 공간은 넓었으며 창문이 많아 공기 순환이 잘 되는 편이었다. 하나같이 등받이가 달린 의자에 테이블은 넉넉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손님끼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고, 화장실은 작긴 하나 깨끗해서 용변을 보러 갈 때마다 심호흡을 할 필요가 없었다. 좋게 말하면 날것의 매력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저분한, 불편과 불쾌는 낭만과 감성으로 퉁치고 넘어가야 하는 이 올드 타운에서 커피사 마리아는 드물게 쾌적하고 편안한 카페였다. 본인의 개성을 과시하려는 욕심이 머무는 이들의 시간을 보장하려는 배려를 압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테다.

이 가게에서 느껴지는 자유분방한 기운은 그때그때의 자연스러운 선택들이 하나둘 쌓인 결과다. 이민선 대표가 카페를 하려고 고민하던 시기에 마리아 작가 역시 작업실을 구하고 있었고, ‘그럼 그냥 같이 해볼까’ 마음을 맞춘 것이 카페 겸 미술 작업실이라는 매장의 초기 정체성을 만들어줬다. 원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하기에는 비용이 부족해 ‘이 머신을 못 살 바엔 브루잉 커피만 취급하자’ 생각했던 게 브루잉 커피 전문점의 방향으로 흘렀으며, 바닥의 본드 자국을 가리려고 산 카펫과 창고를 막아 놓은 커튼이 공간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다. 사람이 빼곡히 들어찬 실내를 답답해하는 주인장의 성향에 따라 좌석 수를 억지로 늘리지 않았고, 디자인 사조와 브랜드에 상관없이 이태원과 동묘와 양평을 돌아다니며 구매한 빈티지 가구는 각기 다른 모양과 색을 뽐내며 묘한 시너지를 내는 중이다. 현실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기호가 만나 형성된 가게 고유의 색깔과 취향. 적어도 내게는 이쪽이 전시와 설득을 위해 세팅한 콘셉트나 세계관보다 흥미롭다.


오픈 이후로 6년이 흘렀다. 그사이 을지로의 이웃 가게들이 적지 않게 문을 닫았다.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은 건 여기도 마찬가지다. 마리아 작가가 작업실을 옮김으로써 커피사 마리아가 ‘커피사’로 바뀌었으며 이민선 대표가 사랑하던 창 너머의 북한산은 새로 지어진 고층 빌딩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는 폐업도 고려할 만큼 운영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커피사는 한결같이 자리를 지켰고, 또 한 주가 시작될 때면 오전 11시 반에 맞춰 불을 켜고 커피를 내린다. 점심시간에 맞춰 어김없이 모여드는 BC카드와 대우건설 직원들. 초창기부터 드나들던 오랜 단골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즈음, 노트북을 든 프리랜서 작업자와 카페투어를 도는 20대 커플들이 하나둘 빈자리를 채운다.

두 번 이상 커피사를 찾은 이들의 마음은 비슷할 것이다. 여기는 적당히 힙하고 적당히 아늑해서 좋다고. 젊은 감각과 활기 가운데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고. 맛있는 커피와 편안한 좌석과 친절한 사람. 그리고 멋 한 스푼. 이 매력을 6년 동안 닳고 닳도록 느낀 나는 이제 ‘을지로에서 여기만 한 카페 없다’라는 말로 모든 감상을 요약한다. 향긋한 브루잉 커피를 마시며 멍때리거나 책 읽고 싶을 때, 직장인들의 꿀 같은 커피타임에는 무슨 대화가 오고 가나 궁금할 때, 잔뜩 멋 부린 힙스터들의 스타일을 구경하고 싶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커피사로 향해보자.

덧. 이번 취재를 계기로 커피사 이민선 대표와 처음 길게 대화를 나눴다. 이 카페를 6년동안 다녔지만 그간 내게 기본적인 인사 외에는 대화를 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그녀가 불친절하다고 느낀 적 또한 한 번도 없다. 적당한 거리감을 지키는 주인장이 귀하다는 건 카페 몇 군데만 돌아다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커피사
서울 중구 을지로 142-1 건물왼편 안쪽 3층
@coffeesa_euljiro